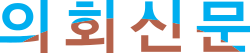대기업의 ‘눈부신 진출’은 유통업만은 아니다. 거의 전 업종으로 확산하고 있다. 돈벌이에 혈안이 되어 있기 때문이다. 업종의 전문적인 특성이 없다면, 영세 상공인들의 생존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음식점들은 체인점으로, 편의점은 대기업 체인으로, 카 센터는 보험회사의 체인으로 편입되어 간다.
우리동네 구멍가게, 슈퍼들이 망해가는 것이다. 실례로 필자가 사는 동네의 지하 대중 목욕탕은 손님이 없어 망했다. 주상복합 고층 건물에 으레 들어서기 마련인 기업형 스포츠센터에 눌린 것이다. 돈 많은 사람들은 헬스 클럽에서 목욕하고, 필자처럼 여유가 없는 사람들은 집에서 목욕하고 1년에 몇 번 대중탕에 갈까 말까 하니 손님이 늘어날 턱이 없는 것이다.
대형 대중탕이 없어진 자리에 슈퍼가 들어왔지만 몇 달을 넘기지 못했다. 될 법도 했으나 공교롭게도 내노라 하는 재벌그룹의 슈퍼가 들어와 밤 11시까지 영업하면서 손님을 빨아들인 것이다. 그 기업형 슈퍼의 영향력은 매우 커서 주변의 조그만 슈퍼들을 여러 곳 문 닫게 했다.
이 같은 유통업의 몰락은 재벌들의 ‘무한 식욕’이라는 비난을 받을 만하지만 영세 소상공인들로서도 반성할 점은 있다. 사업의 위험성을 의식하여 너무 여러 가지를 팔다 보니 대형업체와 단가에서 대항할 길을 잃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다. 소품종 다량이 아니라 다품종 소량으로 상품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다 보니, 낮은 가격을 더 낮추기 위해 주문자 상표방식의 자사브랜드(PB)를 도입하고 최저가까지 보장하는 대기업의 할인점을 따라갈 수가 없게 된 것이다.
일본의 상점에서 보듯이 우리나라도 모자라면 모자, 가방이라면 가방, 전문성으로 승부를 해야 하는데 여건은 그렇질 못한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전문가게도 결코 쉽지 않다. 국민들의 생활패턴 탓도 크다. 책을 사면서도 자동차를 몰고 가서 음식을 먹고 차도 마시고 수다도 떠는 공간을 원하는 것이다. 그러니 서점도 문학이면 문학, 외국어면 외국어로 특화 해야 하는 것인데 그럴 수가 없으니 대형서점을 이길 재간이 없는 것이다.
반면에 희망적인 것도 있다. 최근 대구시 조사에서 전통적인 재래시장이 대형 할인점보다도 쇼핑물가가 약 18%나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래시장은 소품종 다량판매를 지향한다. 재래시장의 옷 가게에서 청량음료를 팔고 있던가, 그릇을 팔고 있던가? 그들은 고기면 고기, 곡물이면 곡물, 청과물이면 청과물, 한 가지에 전념하고 있다. 시장은 가게가 몰려있다는 입지의 특성에서도 절대 유리하다. 때문에 상인들이 단합하여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등 대대적인 리모델링으로 재기에 성공하는 곳들도 꽤 있다.
입으로는 재벌의 독식을 욕하고 반대한다고 하면서도 콩나물이나 두부를 사는 곳도 재벌형 슈퍼요, 재벌형 서점들이다. 그러니 서점이건 전문점이건 영세 상인들의 설 땅이 좁아지는 것이다. 젊은 부부들이 이사 적지(適地)로 대형 할인점의 인근을 선호한다는 것은 상식이 되었다. 아파트 단지의 주부들로부터는 기업형 슈퍼의 입점 규제가 역차별이라는 주장도 나오는 판이다.
정부는 골치 아픈 SSM의 진출 허용 문제가 자신들에게 득 될 것이 없다고 판단하여 지방자치단체에게 떠맡겼다. 직무태만이라고 본다.
실로 오늘의 영세 유통업 생존에는 법률만이 걸린 것이 아니다. 우리나라의 문화도 한 몫 한다는 것을 느낀다. 5대에 걸치는 우동 집이 없고 제과점이 없다는 업력(業歷) 축적의 불모성이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 이제부터라도 영세업종은 일에 자부심을 갖고 연륜을 쌓아 소비자들의 사랑을 키울 필요가 있다. 소비자들도 영세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그들을 돕는 마음이 필요하다.
이제 곧 한가위. 명절하면 떠오르는 것이 있다. 명절 때면 늘 재래시장을 찾아가 선물거리를 마련했다는 고 육영수 여사의 중소기업 사랑이다. 우리들도 이런 삶의 철학을 본받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
- 기자명 김영환 기자
- 입력 2009.09.10 16:22
-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