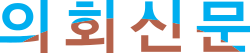송진화 작가 '너에게로 가는 길' 개인전

다음달 8일까지 종로구 통의동에 있는 아트사이드갤러리에서 개인전 ‘너에게로 가는 길 (The Way to You)’을 여는 송진화 작가의 말이다.
동양화를 그리다 지난 2006년부터 나무를 깎기 시작한 송진화 작가는 이번 개인전에 지난 3년간 작업한 나무 조각 작품 40여 점을 선보인다.
찢어진 눈에 짧은 머리를 한 소녀 혹은 여자의 형상을 한 전시작들은 천진난만하면서도 외롭고 치열하며 고통스런 모습이다. 노상헌 임상심리학박사는 송진화의 작품을 “온통 몸부림”이라고 표현했다.
“살려는 몸부림, 고통의 몸부림, 욕망의 몸부림, 먹지 못한 사랑의 몸부림, 외로움과 분노의 몸부림, 지침의 몸부림, 당돌함의 몸부림, 그리움의 몸부림, 정화됨의 몸부림 그리고 탄생의 몸부림을 보여준다.”
통유리로 된 전시장에 들어서면 일단은 싱긋 미소를 짓게 된다. 등에 고양이를 업고 슈퍼맨처럼 날아가는 소녀의 조각상 때문이다(작품명 ‘지구를 지켜라’). 그 소녀는 작은 꽃송이에 앉아있기도 하고, 통 유리문에 스파이더맨처럼 찰싹 달라붙어있기도 하다. 하지만 지하로 연결된 전시장에 들어서면 밝고 서정적이며 천진난만한 분위기는 사뭇 달라진다.
소녀 혹은 여자는 때로는 공포영화의 한 장면처럼 침울하게 쪼그리고 앉아있고 때로는 두 손 위의 약병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다(‘최후의 만찬’). 비에 젖은 채 우는 듯 웃고 있거나(‘나는 우산이 없어요’) 바닥에 산산 조각난 조각들을 밟고 거울 속의 피멍 든 자신을 들여다보고 있다('이제는 돌아와 거울앞에선…').
몸부림은 ‘엄마의 청춘’이라고 명명된 공간에 가면 좀 더 직접적으로 드러난다. 벽 중간쯤 온몸을 난도질당한 여자가 위태롭게 서있고, 바닥에는 물에 빠진 여자가 구조를 요청하는 듯 두 손을 뻗치고 있다. 식칼이 여기저기 널려있고 그 식칼이 여자의 가슴을 뚫고 나와 있기도 하다. 엄마들은 이토록 소름끼치는 파란만장한 삶을 살아온 걸까.
최근 전시장에서 만난 송진화 작가는 “결코 파란만장한 삶을 살지 않았다”고 부인했다. 그는 “정말 평범하게 자랐다”며 “다만 예민한 천성을 타고났는데 그동안 제 자신을 돌보지 못했다”고 했다.
“제가 여자라 여자의 형상을 하고 있을 뿐이지 여자의 삶이라든지 한을 토로한 게 아니다. 칼은 일종의 카타르시스다. 칼의 단호함, 뜨거움과 차가움에 매혹됐다.”
작가의 말처럼 다수의 작품이 아프다고, 힘들다고 몸부림치고 있지만 나무의 따뜻한 질감때문에 그렇게 차갑게 느껴지지 않는다. 오히려 그 소녀 혹은 여자들을 오랫동안 응시하다보면 내 안의 상처 입은 자아를 보는듯해 공감과 치유의 정서가 전달된다.
실제로 우리들 대다수는 평범한 가정에서 자랐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누구나 다 크고 작은 상처가 있다. 심리학에서 흔히 말하는 '내면의 아이'다. 어린 시절 받아야 할 사랑과 관심을 받지 못해 상처받은 그 아이가 우리 마음 깊숙이 자리잡고 있다.
보통 그 상처는 결혼해 자식을 낳아 기르다보면 자연스레 드러난다. 한 아이의 부모가 되면서 내 부모를 떠올리게 되고 그동안 잊고 있었던 어린 시절 상처를 떠올리게 되는 것이다. 50대 중반인 송진화 작가가 이제서야 그 내면의 아이를 만났다니 좀 늦다 싶다.
송진화 작가는 “하나뿐인 딸이 서른”이라며 “딸 어릴 적에는 저도 어리고 미숙해 딸뿐만 아니라 제 자신조차 돌볼 겨를이 없었다”고 했다.
“2년 전 아버지의 투병을 계기로 내면의 아이를 만나게 됐다. 상담하는 친구가 아버지를 잘 보내드리라고 했다. 손부터 잡아보라고 했는데, 아버지와 스킨십을 해본 적이 없어 손을 잡기가 그렇게 어렵더라.”
하지만 용기를 내 한번 잡아본 아버지의 손은 따뜻했다. “제가 아버지의 살성(살갗의 성질)을 닮았다는 것을 그때 알게 됐다.”
그렇다면 엄마에 대한 기억은 어떨까? 부잣집 딸이었던 엄마는 가난한 교사였던 아버지와 결혼해 경제적으로 고생이 심했다. 엄마는 성격도 강했다. 송진화 작가는 아직도 자신의 손을 차갑게 뿌리치던 엄마의 손을 생생히 기억한다.
“엄마와도 살가운 스킨십이 없었다. 나이든 지금은 반찬을 잔뜩 해 배낭에 짊어지고 제 작업실까지 찾아와서 나무 깎다 손 다친다고 걱정을 한다. 아마도 엄마는 제 손을 뿌리친 것도 기억 못할 것이다.(웃음)”
감정을 표현하는 언니와 달리 속으로 삼키는 성격도 한몫했다.
송 작가는 “마치 벌판에 혼자 서있는 기분으로 살았다”고 했다. “난 강해야한다. 남에게 민폐 끼치면 안 된다.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상처받지 않으려고 둔감하게 살았다.”
눈물을 머금고 주먹을 꼭 쥔 채 뒤돌아 서있는 소녀의 조각상엔 ‘무섭지 않아 무섭지 않아 무섭지 않아’라는 제목이 붙어 있다. 강해지려고 애절하게 자기최면을 거는 듯한 모습에 마음이 짠해진다.
예민한 감성과 뜨거운 심장을 가진 송작가는 다행히 나무를 깎으면서 마음이 편해졌다.
그림을 그릴 때는 좀 답답했다. 하지만 나무를 깎으면서 잡념이 사라졌다. "제가 몸을 움직여 몸으로 풀어야 하는 사람이었더라."
“내면의 아이는 막 인지하고 알아가는 중이다. 전부 다 수용한 것은 아니다. 때로는 내면의 아이와 마주하고 싶지 않을 때도 있다. 진실을 아는 게 불편하다.”
전시장 한쪽에는 하얀 커튼이 드리워져있다. 그곳에는 천장에서 내려오는 긴 줄에 갓 태어난 아이가 매달려있다. 의자도 하나 놓여있다.
아마도 그 아이는 충분히 사랑받지 못한 이 세상의 무수한 나일지도 모르겠다. 누구라도 와서 그 아이를 자신이라 생각하고 꼭 안아주라는 작가의 마음이 느껴졌다. 다음달 8일까지 열린다.
편집부 기자
webmaster@icouncil.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