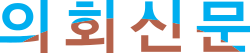【의회신문】 은행들이 제때 빚을 갚지 못한 연체 채무자를 상대로 매년 3만∼4만명에게 채권연장을 실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채권·채무관계의 첫 소멸시효인 5년에 더해 10년 연장, 10년 재연장 등으로 경우에 따라선 사망할 때까지 연체자 꼬리표를 달아야 한다.
12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16개 국내 은행은 지난해 3만9695명의 대손상각채권 소멸시효를 연장했다.
대손상각채권은 연체가 발생한 지 1년이 지나 은행 장부에 '손실'로 기록되고 충당금을 쌓은 채권이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빚을 받아내려고 소송을 제기해 시효 완성을 미루는 것이다.
시효가 연장된 대손상각채권은 2014년 3만3552명에 원리금 1조1333억원, 2015년 2만9837명에 7384억원, 2016년 3만9695명에 9470억원이다.
올해는 1분기 만에 1만5459명, 원리금 3143억원의 소멸시효가 연장됐다. 연간으로 따지면 6만명, 1조원을 넘는 규모다.
10∼20년이 지나도 채무자가 "돈이 없어 못 갚겠다"고 버티면 은행은 연장을 포기한다. 이로써 소멸시효는 완성된다. 빚을 갚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죽은 채권'으로 불리는 포기 채권은 2014년 1만3581명(원리금 3천127억원), 2015년 1만394명(1606억원), 2016년 1만1536명(1891억원), 올해 1분기 2801명(366억원)이다.
이들은 빚 독촉에서는 벗어나지만 은행들이 자행 전산에서 기록을 지우지 않기 때문에 연체기록은 남게 된다. 은행이 시효 완성 채권을 소각해야 비로소 정상적인 금융 거래가 가능해진다.
은행들 소각 규모는 2014년 1732명에 원리금 174억원, 2015년 2131명에 125억원에 그쳤다.
특히 신한은행, 우리은행, SC은행, 농협은행, 산업은행은 작년까지 소각이 전무했고, 국민은행, KEB하나은행도 재작년까진 전무했다가 작년에야 처음으로 소각이 이뤄졌다. 반면 기업은행은 매년 1000명, 40억원 규모로 꾸준히 소각했다.
은행들의 이런 상황은 올해 들어 바뀌었다. 2015년까지 사실상 전무하던 채권 소각이 지난해 2만9249명(5768억원)으로 늘더니 올해 1분기에는 9만943명(1조4675억 원), 2분기 1만5665명(3057억원)으로 급증했다.
이는 '소액·장기연체 채무의 과감한 정리'와 '죽은 채권의 관리 강화'를 밝힌 문재인 대통령의 가계부채 관련 대선 공약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죽은 채권은 올해 2분기 소각분 기준으로 원금이 722억원, 이자가 2335억원이다. 이자가 원금의 3배를 웃돈 셈이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국민행복기금이 보유한 소액(1000원 이하)·장기(10년 이상) 연체 채권뿐 아니라 민간 금융회사 소액·장기 연체 채권까지 정부가 사들여 소각하는 방안을 금융위원회에 주문했다.
다만 이 경우 부실채권시장에서 유통되는 금액(액면가의 2∼4%)으로 사들이더라도 최소 수백억원의 예산이 추가 편성돼야 한다.
박용진 의원은 "사회적 합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 죽은 채권 소각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향후 저소득계층 차주들의 상환여력을 객관적으로 심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 소액채권, 이자가 원금을 넘어선 채권 등에 대해 정책적 지원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종구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장기·소액 연체채권 소각 등 신용회복 방안, 소멸시효 완성 채권의 관리 강화에 대해 정책적 소신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며 "인사청문회에서 관련 내용을 검증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