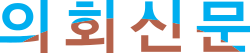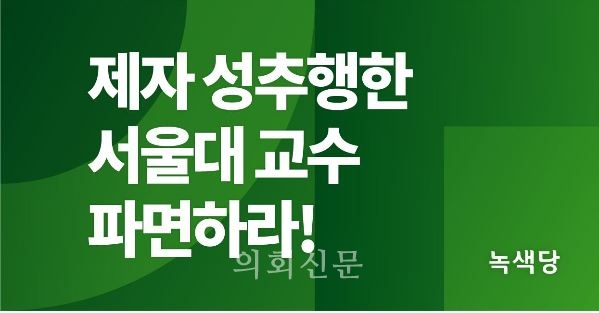
해외 학회에 동행한 제자를 세 차례에 걸쳐 강제로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의 서울대 서어서문학과 교수에 대한 징계가 지지부진이다. 최종 처분이 계속 미뤄지는 가운데 피하자는 더해가는 고통을 호소하며 1인 시위에 나섰다.
서문과의 동료 교수들은 가해자의 징계 수위가 낮아지도록 다방면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피해자와 그 연대자들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와 직간접적 불이익 부과’라는 너무나 전형적인 추가 가해가 이 사건에서도 반복되고 있다.
피해자가 서울대 인권센터에 피해 사실을 알린 것이 작년 7월이다. 그러나 고작 정직 3개월이라는 미흡한 징계를 ‘권고’한 것이 인권센터가 행한 조치의 전부였다. 서울대 징계위원회도 ‘논의 중’이라는 변명으로 시간을 끌고 있으며 징계수위도 인권센터 권고를 따를 가능성이 높다.
대체 마땅한 정의를 회복하는 일이 왜 이리도 어려운가. 지도교수라는 절대적 권한과 권력을 가진 이가 제자에게 해외 학회 중에 수차례 성추행을 했다. 이런 악질적 행동에 어떤 변명의 여지나 면죄의 가능성이 있는가.
피해자는 피해를 호소하고 입증하기 위해 지난한 시간을 고통받는 동안, 가해자는 쓸 수 있는 모든 지위, 인맥, 자원을 동원해 책임에서 빠져나간다. 이런 ‘고통의 수레바퀴’는 왜 모든 조직, 모든 상황에서 반복되는가.
가해자 징계가 지지부진하면 같은 공간에서 제자이자 하급자로 공부하고 일해야 하는 피해자의 고통은 커져만 간다. 결국 ‘가해자는 남고 피해자가 견디지 못해 떠나고야 마는’ 각종 조직 내 크고 작은 성차별, 성폭력 사건에서 반복되는 악순환이 이번에도 되풀이될 참담한 상황이다.
서울대 징계위는 가해 교수를 단 하루도 미루지 말고 당장 파면해야 한다. 자신의 행동에 일말의 책임도 회피하는 반성 없는 가해자가 학교 조직 내에 남아있으면 가해는 반드시 반복된다. 국립대 교수의 성범죄를 일벌백계하지 않으면 이 정도 행동은 별일 아니라는 잘못된 사인을 또 한 번 우리 사회 전체에 주게 된다.
어느 조직도 성차별, 성폭력 사건의 발생 자체를 원천적으로 막을 순 없다. 다만 그런 일이 발생하고야 말았을 때, 구성원들이 얼마나 책임감 있게 대처하고 피해자 입장에서 사건을 마주하는지가 그 공동체의 성숙과 품위를 나타내는 것이다.
서울대 교무처와 징계위원회 등 교내 책임 있는 기구와 결정권 있는 지휘 감독자들은 지금이라도 피해자의 피해 회복과 가해자의 합당한 처벌을 위한 적극적인 행동에 나서길 강력하게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