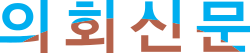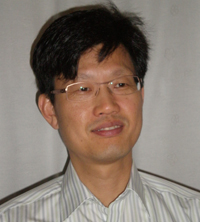
‘QWERTY 경제’란 재미있는 말이 있다. 쿼티는 키보드자판 맨위 왼쪽의 영어순서이다. 아무 의미가 없다. 그렇지만 사람들이 쿼티를 쓰다보면 익숙해지고 당연해지고 그리고 하나의 고정된 현상으로 인식된다. 아무리 객관적인 효율성을 들이대며 키보드자판의 새로운 배열을 주장해도 쿼티를 바꾸기는 정말 어렵다. 노벨경제학 수상자인 톰 크루그만은 이런 쿼티 이야기가 더 이상 사소한 이야기가 아니라고 역설한다. 이유인 즉 애덤 스미스가 국부론의 서두에서 묘사한 핀 공장의 경우와 같이, 그것은 우리의 눈을 열어 경제에 대해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생각할 수 있게 해 주는 우화라는 것이다. 그 다른 사고방식은 시장 경쟁의 결과가 때로는 역사의 우연에 결정적으로 좌우된다는 것이다. 소위 경로종속path dependence이다. 즉 끝나는 지점이 도중에 발생하는 사태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이다.
물론 이와 같은 결론에는 정치적 의미가 담겨있다. 왜냐하면 머리를 쓸 줄 아는 정부라면 역사의 우연을 정부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갈 수도 있겠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산업입지이다. 산업입지를 결정하는 역사와 우연의 역할에 대해서는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 카페트는 왜 하필 미국 조지아주 댈튼에서 만들어지는가. 산업의 지역화는 경로종속이다. 역사적 우연의 강력한 역할이다. 실리콘밸리는 스탠퍼드대학의 부총장 프레드릭 터먼의 비전에 따라 1940년대 소수의 첨단 산업을 지원하면서 주변에 유명한 첨단 산업의 집중을 결절 맺게 한 씨앗이 뿌려졌던 곳이다. 댈튼의 카페트산업은 결혼 선물로 술을 단 침대커버를 선호한 10대 소녀들을 노리고 1895년에 이 지역에 들어서면서 산업 집중의 계기를 맞았다. 당시에는 지역수공예산업으로 시작되었다가 2차 대전 후 술을 단 카페트가 천을 짜서 만든 융단을 대체하게 되면서 수공예산업으로 닦여진 숙련기술이 결정적 역할을 하였던 것이다.
워낭소리의 성공을 나는 이러한 쿼티경제학, 경로종속의 측면에서 보고 싶다. 누군가는 ‘특별한 마케팅’ 덕분에 돈을 많이 벌었다고 비아냥거리는 듯하다. 이는 결과적 해석일 뿐이다. 워낭소리는 대박을 터트릴거라고는 예상하지 않은, 작은 일의 시작이었다. 그것은 한국의 제일 큰 멀티플렉스 개봉관을 잡은 한국의 첫 다큐멘터리 독립영화였다. 처음이었고 그것이 성공한 것이 중요하다. 다큐멘터리의 리더 감독의 마인드셋 그리고 그것을 지지하는 정책결정자들의 마인드셋이 지금의 결과를 가져온 것이다. 지금의 정책은 다시 2-3년뒤, 이삼십년뒤의 한국영화산업에 어떤 큰 영향을 끼칠지도 모른다. 재미없어 소외되던 다큐멘터리장르가 차마고도로 TV에서 인기를 끌더니 기어코 영화관에서 다큐멘터리가 흥행에 성공하는 시대가 되었다. 다큐멘터리에 관심 있다가 평생의 일로서는 안 되겠다 했던 이들도 마음을 다시 잡았을 것이다. 물론 그들은 실패할 수도, 거품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똑똑한 고급인력들이 몰리면 상황은 달라진다. 그렇게 된다면 새로운 장르가 또 만들어질 것이다. 창조력이라는 바퀴에 엔진을 다는 것이다. 시작은 작지만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것들에의 투자가 진정한 투자이다. 그것이 워렌버핏의 가치투자법이고 빌게이츠의 디지털신경망이고 구글 롱테일의 근간이 아니던가.
작은 것에의 투자가 결과적으로 실패로 끝날 수도 있으나 역사는, 특히 현대의 역사는 그런 “수많은 작은 것 속에서의 우연성”에 기대고 있다. 될 놈만 키운다고 하지만 그건 장치산업 중화학산업이 번창하던 시기의 이야기이다. 창조성이 지배하는 현대시대에는 누가 무엇이 될지 아무도 모른다. 잘 될 놈은 떡잎부터 알아본다고도 하지만 대기만성적 인간과 기업도 도처에 널려있다. 어려울 때 작은 돈은 풍족할 때 큰 돈의 몇 배의 효과를 갖는다. 사회 곳곳에 잠재해있는 ‘작은 것’들에게 활력을 갖도록 만드는 모세혈관적 역할은 경제위기를 구원하는 현대 국가의 또 다른 경쟁력이 되어 가고 있다. 그런 면에서 워낭소리에 다시한번 박수를 보내고 싶다.
- 기자명 편집부 기자
- 입력 2009.03.09 17:57
- 댓글 0